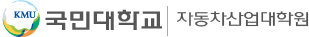[일간스포츠] 2005-11-18 17:57
STX 사내 강당. "시장 경쟁은 날로 치열해진다. 고객을 흥분시키지 않고는 도저히 시장에서 살아날 수 없다. 우리 기업은 드넓은 해양에서
미래를 봐야 한다. 여러분이 뻗어 나가는 족족 역사가 된다."
시작하자마자 졸고, 강사의 "끝으로"란 말에 일제히 잠을 깬다는
이른바 사내 강의. 한 강사가 열을 올리며 강의하고 있다. 그런데 웬걸. 강의를 듣는 직원들은 졸기는커녕 눈망울이 초롱초롱하다. 때때로 쏟아지는
강사의 노래. 그리고 퀴즈 속사포. 직원들은 영업 전략 강의를 듣는 건지, 회사의 비전을 배우는 건지, 노래를 배우는 건지 헷갈린다.
열혈 강사의 정체는 바로 김성국 서울프로 감독(46). 사가 전문 작곡가이자 제작자이다. 우리나라 1000대 기업 중 무려
550여 개 기업의 사가를 직접 작곡.제작했다.
■ 대학 합창단 사상 최초 신입생 지휘자
김 감독의 대학 전공은
엉뚱하게도 토목건축공학이다. 그에게 음악은 운명처럼 다가왔다. 어릴 적 교회에서 만났던 바리톤 최현수 한국종합예술학교 교수에게서 성악을 배웠다.
고등학교 때는 교생 실습을 나온, 조영남의 동생인 조영수 부산대 교수를 만나 음악에 대한 꿈을 키웠다. 음대를 가고 싶었지만 집안의 반대가
심했다. 하지만 삶의 안테나는 항상 음악으로 향해 있었다. 음악에 대한 끼를 주체하지 못해 가입한 국민대 합창단 동아리에서 사상 최초로 신입생이
지휘를 맡기까지 했다.
"그렇게 음악을 좋아했다는데 하필이면 사가인가?" 직격탄을 날리자 김 감독은 "음악을 운명으로 삼아 먹고
살길을 찾은 것"이라고 되받는다. 그는 작은 프로덕션에서 사회에 첫발을 내디뎠다. 음악이 좋아 들어간 회사이긴 하지만 정작 자신이 발로 뛰어
수주한 한 기업의 사가를 만들어 줄 작곡가가 없었다. 급한 김에 직접 만들어 당시 MBC 관현악단 지휘자이자 1988 서울 올림픽 음악 감독이던
김휘조 선생에게 달려갔다. 이것저것 손을 보더니 하는 말씀, "너 작곡에 소질 있다". 음악으로 인정받은 첫 번째
사건이었다.
■ 홍보 담당자의 표정에서 발견한 미래
"음악 시장은 작곡가 세상이다. 프로덕션 시절 어떤 기업의 홍보
담당자가 직접 찾아와 '사가를 제작해 달라'고 일을 맡겼다. 담배꽁초와 소주병이 굴러다니고, 쓰레기통에는 쓰레기로 넘치는 사무실 분위기에 익숙지
않은 그 홍보 담당자가 지었던 황당한 표정이 가관이었다." 김 감독은 그 홍보 담당자의 표정에서 자신의 미래를 발견했다.
프로덕션의
일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았다. 삼성코닝 홍보실서 사내 방송 PD를 했다. 작은 프로덕션에서는 배울 수 없는 조직력, 매뉴얼화, 표준화를 그곳에서
배웠다. 여기에 기획력까지 생겼다.
자신이 생겼다. '그래, 사가로 나가는 거다.' 회사의 노래야말로 자기가 좋아할 수 있는
음악을 할 수 있는 길이다. 틈새 시장. 좀더 유식(?)하게는 음악 시장의 블루오션인 셈이다. 프로덕션에서, 삼성코닝에서 뭔가 엮일 듯하면서도
엮이지 않았던 일들이 순식간에 머리를 스치며 제각각이던 씨줄과 낱줄이 절묘하게 결합됐다. 단 2초 만에 모든 것을 결판낼 수 있다는 '블링크'가
적용되는 순간이다.
비행기는 활주로를 찾기까지는 그 큰 몸체를 쩔쩔매지만 일단 활주로를 찾으면 한순간에 활공한다. 김 감독이
그랬다.
■ 대기업의 눈높이 맞춰 주니 작업이 술술
"우리 스태프들은 아침마다 경제지를 읽는다. 기업의 M&A, 기업의
주력 제품 변경, CEO 근황을 자세히 체크해 가며 주요 기사를 오려서 스크랩하고 열람한다. 그리고 사가 제작 제안서를 보낸다." 예전엔
적중률이 1할을 밑돌았는데 이젠 1할 5푼에 육박한다고 한다.
음악적 기반이 굳건한 상태에서 카운터 파트인 회사 홍보실을 대상으로
존재를 알리기 시작했다. 김 감독의 접근 방법은 확실히 달랐다. 사가를 제작하는 프로세싱 과정과 제작 매뉴얼을 브로셔로 만들어 보여 줬다.
사무실은 최대한 깨끗한 상태에서 홍보실 직원들을 맞았다. 항상 시안은 1, 2, 3안을 만들어 제출했다. 음악인으로서는 드물게 대기업의 업무
패턴 눈높이를 맞춰 줬다.
소문은 꼬리를 물고 홍보 네트워크를 탔다. 기업의 홍보 담당자들이 몰려들었다. 84년부터 시작한 사가
제작 건수가 순식간에 100개사를 넘어 이제는 550여개 기업에 이른다.
■ 상호도 없는 기업. 무식한 기업.
김 감독의
기획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사가 제작 광고도 냈다. "상호도 없는 기업? 무식한 기업. 사가가 없다면?" 이 광고를 본 프로축구 포항
스틸러스의 단장이 즉각 포항으로 내려오라고 전화에 대고 호통을 쳤다. "당신이 얼마나 유식한지 한번 보자." 포항에 내려가자마자 즉석에서
응원가를 계약하고 돌아왔다. 그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순간이다. 하지만 음악은 어디까지나 음악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사가야말로 눈 감고도 만들 수 있는 너무 단순한 음악이다. 4분의 4박자로 리듬 몇 개만 믹싱하면 곡 하나가 뚝딱 나온다.
적어도 김 감독 이전까지만 해도 사가는 그렇게 인식됐다.
"하지만 생각해 봐라. 그렇게 만든 사가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듣는
직원들은 얼마나 짜증나겠나. 직원들이 듣고 한마음이 될 수 있는 곡을 만드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일단 작업을 수주하면 그 기업에
빠져든다. 기업의 이념, CEO 마인드를 체크하는 것은 물론 주가, 재무제표까지 확인한다. 그 다음엔 통영이든, 속초든, 괌이든 사람 드물고
경치 좋은 곳에 나 홀로 베이스 캠프를 차린다."
김 감독은 1년에 대략 10~15개 기업의 사가를 제작한다. 일년 내내 한 기업의
내용을 머리에 담고 털고를 반복한다. 나 홀로 베이스 캠프는 바로 앞서 작업했던 기업의 악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다. 그는 "작업을 의뢰한
기업에 대한 예의"라고 잘라 말한다.
■ 구성원 일체감 작업 사가만한 게 있나요?
김 감독은 금융권은 아예 통틀어
자기의 아성이라고 생각한다. 제1금융권은 물론 한투.대투의 제2금융권, 일은.동원 증권 등 제3금융권에 자신이 만든 사가가 울려 퍼지고 있다.
하지만 막상 금융계의 꼭대기라고 생각했던 한국은행까지는 자기의 손길이 닿지 못했다.
요즘 김 감독은 휘파람이라도 불 것처럼 신이 나 있다. 최근 한국은행의 새로운 행가(사가) 작곡인으로 선정되면서 명실상부한 금융권
제패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기 때문이다. 또 한국전력 7개 계열사 중 4개 회사의 사가를 맡았다.
"경력직 채용, 고급 두뇌
스카우트, 기업의 흡수 합병(M&A)이 일상화하면서 자의든 타의든 일터가 바뀐 이들에게 소속감과 기존 구성원과의 일체감을 심어줄 수 있는 사가가
주목받고 있다. CI(corporate identity) 통합 작업이 활발하듯 SI(sound identity)도 중요하다. 사내 방송은 물론
전화 ARS, 경기장 응원가, 스폰서 행사까지 음악도 기업 이미지를 통일시킬 수 있는 중추 역을 맡고 있다."
이 정도 되면 김
감독에게 사가는 '신앙'이다. 의뢰받은 사가를 제작하기에 앞서 작곡한 음악을 자신의 북아현동 스튜디오에서 불러 보는 김성국 서울프로 감독.
김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