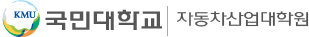| [중앙일보]교수에서 구슬공예가로 인생 2막 … 내 작품 짝퉁도 팔린다네요 / 김인숙(사회학과) 명예교수 | |||
|---|---|---|---|
|
“설마 저 사람이 직접 장신구를 만들겠느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조금도 신경 안써요. 남이야 뭐라고 하든. 내가 알고, 주변 사람들은 다 아니깐.” 지난 24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서울 신문로 성곡미술관에서 ‘구슬정원 열한 번째 전시’를 여는 김인숙(75) 국민대 명예교수(사회학)다. 그가 ‘직접 장신구 만들겠느냐’는 오해를 받는 건 그의 ‘배경’ 때문이다. 고(故) 김성곤 쌍용그룹 창업주의 맏딸로 태어난 김 교수는 일본과 미국에서 중·고교와 대학을 다녔다. 뉴욕대·연세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딴 후엔 국민대 사회학과에서 20년 넘게 학생들을 가르쳤다. 2003년 정년퇴임과 동시에 구슬공예가로 변신해 그해부터 매년 전시회를 열어오고 있다. 지난 19일 서울 한남동 자택에서 김 교수를 만났다. 각종 구슬들이 어지러이 널려 있는 작업실을 보여준 뒤에야 그는 말문을 열었다. “성곡에서 갖는 첫 번째 개인전이나 마찬가지예요. 2003년에도 성곡에서 전시를 했지만 그때는 그룹전이었거든요.” 성곡미술관은 그의 아버지를 기념하기 위해 만든 미술관이다. 구슬을 모으기 시작한 건 미국으로 건너간 이후다. 주말이면 보스턴 근교 골동품 시장을 다니며 비취·산호·유리 등 각종 구슬을 사모았다. “그때는 막연히 모으기만 했어요. 초등학생 때 봤던 비즈 백에 대한 환상이 남아 있었거든요.” 한국에 돌아와서도 해외여행을 나갈 때면 골동품 시장을 빠지지 않고 들렀다. 티베트에 갔을 때였다. 시장 상인이 착용하고 있는 호박 목걸이의 투박한 디자인이 마음에 쏙 들었다. 상인이 부르는 대로 200달러를 건네고 호박을 손에 넣었다. 그렇게 모인 구슬들이 한때 양문형 냉장고 3대 분량에 이를 정도였다. 교수직에서 물러날 시기가 되자 2003년 1월부터 그동안 모은 구슬들로 목걸이·브로치·노리개 등의 장신구를 만들기 시작했다. 장신구의 크기가 하나같이 다 큼지막한 게 그의 작품 특징이다. “장신구의 목표는 나를 더 돋보이게 하는 거예요. 크지 않으면 소용없죠.” 값나가는 금·다이아몬드는 일부러 사용하지 않았다. 분실 염려 때문에 착용하는 걸 꺼려선 안 되기 때문이다. 그해 6월 첫 번째 전시가 성공적으로 끝났다. 입소문이 나면서 남대문시장에 김 교수의 작품을 본뜬 짝퉁이 팔린다는 소문도 들려왔다. “남대문시장에 가면 어떤 가게에서 내 작품이 실린 도록을 펴놓는다는 거예요. 이거 하고 똑같이 만들어주겠다고. 그래서 찾아갔지요.” 다녀와서 든 생각이 ‘김인숙 작품 짝퉁이 나올 정도면 내가 작업을 더 해도 되는 거 아닐까’였다. 올해 전시는 비취·유리 등으로 꽃을 만들어 선보인다. 그동안 김 교수의 장신구를 사간 사람들로부터 벽에 걸고 감상할 수 있도록 액자형식으로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고 한다. 김 교수는 미술 수업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껏 공예활동을 즐기면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종종 구슬이 깨지거나 제대로 맞물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렇지만 금속의 재질이나 성분을 공부할 생각을 않는다. “따로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제멋대로지만 디자인이나 소재에 경계가 없지요.” 스스로 인생 2막을 성공적으로 살고 있다고 자부하는 그는 “은퇴 이후 삶의 설계는 20대부터 해야 한다. 항상 안테나를 달고 다니면서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고민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원문보기 : http://joongang.joins.com/article/aid/2014/09/25/15487053.html?cloc=olink%7Carticle%7Cdefault 출처 : 중앙일보 | 입력 2014.09.25 01:18 / 수정 2014.09.25 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