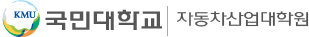언론속의 국민
| 지리산문화권/국민대 국사학과 문화권연구팀 | |||
|---|---|---|---|
|
[서울신문 2004-09-11 13:09]
●지리산 일대 역사문화적 특성 새롭게 조명 지리산은 여러 이름을 갖고 있다. 어리석은 사람이 머물면 지혜롭게 된다고 해서 지리산(智異山)이라 했고,백두대간의 주맥이 한반도를 타고 이곳까지 이어졌다고 하여 두류산(頭流山)이란 이름을 얻었다. 그런가 하면 도교의 삼신산 가운데 하나인 방장산(方丈山)으로 불리기도 한다. 험준한 산세를 이루는 지리산은 전라남·북도와 경상남도에 걸쳐 웅장하게 자리잡고 있다. 산 서쪽에는 섬진강과 보성강이 휘돌아 남원에서 남해로 나가고,동쪽으로는 남강과 경호강이 휘어져 함양에서 진주를 거쳐 낙동강으로 흘러든다. 이 강들이 사람과 물산의 통로였다면,지리산의 웅혼한 품은 우리 민족의 사상과 기맥을 키워간 터전이었다. ‘지리산문화권’(역사공간 펴냄)은 ‘민족의 어머니산’인 지리산 일대의 역사문화적 특성을 새로운 시각에서 밝힌 책이다. 7명의 한국사 전공 교수와 박사급 연구자들로 구성된 국민대 국사학과 문화권연구팀이 10여 차례에 걸친 현장 조사를 거쳐 완성했다. 연구팀은 전국을 10개 문화권으로 나눠 우리 역사문화의 갈래를 찾는 역사문화총서를 펴낸다는 목표 아래 이번에 ‘지리산문화권’을 내놓았다. ‘안동문화권’과 ‘경주문화권’에 이은 세번째 책이다. ●화개장은 영·호남 상권의 중심지 지리산문화권은 크게 서쪽의 섬진강·남원문화권과 동쪽의 남강·진주문화권으로 구분된다. 섬진강·남원문화권은 남원·곡성·구례·광양·순천 등지를,남강·진주문화권은 진주·하동·산청·함양 등지를 아우른다. 두 문화권은 지리산문화권이라는 큰 틀 안에서 각기 소문화권을 이룬다. 지역에 따라 향토색의 차이는 있지만 이들 지역은 지리산이라는 구심력에 의해 문화적 동질성을 지닌다. 이 책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지리산을 영·호남의 사람들과 사상이 화합하고 공존하던 역사의 광장이자 구심점으로 본다는 점이다. 지리산을 흔히 영·호남의 경계로 인식하는 것과는 정반대다. 연구팀은 지리산의 산길과 물길,관문,장시(場市) 등을 통해 영·호남이 한데 어울렸던 자취를 찾아낸다. 지리산을 에워싼 섬진강,경호강,남강 등을 중심으로 사람과 물산의 교류가 활발했던 사실을 밝힌다. 안음의 황석산성,진안의 웅치,운봉의 팔량치,구례의 석주관 등 영·호남을 잇는 4대 관문을 비롯해 남원의 인월장과 하동의 탑원장(화개장) 등 지리산 장시의 요소요소를 살핀다. 이중 벽소령을 따라 인월장과 연결돼 있는 화개장은 영·호남의 물산이 한데 모이는 지리산 길목의 시장으로 이곳 상권의 중심이다. ●남명학파·선종의 진원지도 지리산문화권 지리산문화권이 영·호남의 구심 역할을 한 것은 사상적인 면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민족 고유신앙인 성모(聖母)신앙과 산신신앙,조선시대 남명학파,선종의 입장에서 교종을 융합한 조계종 등 여러 사상이 지리산문화권에서 형성 또는 발전했다. 책은 이런 과정에서 영·호남의 구분은 존재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한다. 영·호남을 생성 배경으로 하는 남명학파는 그 두드러진 예다. 남명은 말년에 지리산 자락 덕산에 정착해 후학양성에 힘을 쏟았다. 그의 문인들은 16세기 후반 진주를 중심으로 남명학파를 크게 일으켰다. 남명학맥은 지리산 일대뿐 아니라 경상우도 지역으로 확산됐으며 호남의 순천·남원 등지로 뻗어나갔다. 남명의 문인들은 일본군에 맞서 자신의 기반인 경상우도를 중심으로 봉기했지만 호남의 유림들과도 폭넓게 손을 잡았다. 지리산이 영·호남을 하나로 있는 구심 역할을 했음은 변혁의 시기의 민족운동 양상을 보아도 알 수 있다. 1861년 지리산 기슭의 단성에서 시작된 농민항쟁은 1862년 진주농민항쟁으로 이어졌고,이는 섬진강을 넘어 호남지역으로까지 확대됐다. 또 1894년 동학농민전쟁 때는 영·호 대도호소가 설치돼 동학농민군이 섬진강을 넘나들며 활동할 수 있었다. 이 책은 이처럼 영·호남을 아우르는 ‘지리산문화권’의 역사문화를 처음으로 통사적인 시각에서 다룬다. 그런 점에서 개별적인 유물이나 유적의 감상차원에 그치는 기존 문화유적답사서와 구분된다. 역사지리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크게 부족한 한국 사학계의 현실을 감안하면 이 책의 의의는 더욱 크게 다가온다. 1만 5000원. 김종면기자 jm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