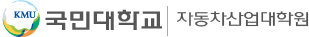언론속의 국민
| <중앙유라시아의 역사>(소나무 펴냄) / 이평래(국민대 한국학연구소 책임연구원) 편역 | |||
|---|---|---|---|
|
오랑캐도 야만인도 아닌 ‘그들’의 역사
[한겨레 2005-05-13 19:42] 훈, 흉노, 위구르, 돌궐, 스키타이 등…. 유럽의 영광인 로마제국을 위협했으며 ‘중화’의 땅 중국과 끊임없이 부딪친 이들 민족은 유럽사에서는 ‘야만인’, 중국사에서는 ‘오랑캐’로 등장하는 역사의 주변인이었다. 유럽과 중국의 중심에서 볼 때에 주변으로 비친 이들의 역사는 유럽·중국사의 프리즘을 통해서야 겨우 자신의 존재를 드러냈던 ‘타자의 역사’였다. 우리는 그들이 주인공이 되는 그들의 역사를 얼마나 알까. 목소리 큰 유럽과 러시아·중국 사이에 낀 광활한 초원과 사막, 고원 지대에서 수천년을 바람처럼 모였다 흩어지며 살았던 중앙유라시아의 역사를 다룬 본격 통사 <중앙유라시아의 역사>(소나무 펴냄)가 국내에 번역 출간됐다. 일본 역사학자 7명이 2000년에 낸 책을 이평래(국민대 한국학연구소 책임연구원)씨가 우리말로 옮기고 읽기 쉽게 내용을 보완했다. 지금 그들은 어디에 있는가? 그들은 지금 몽골국, 중국의 내몽골·티베트·신장위구르자치구, 1991년 옛 소련에서 독립한 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 그리고 러시아연방에 속한 부랴트·투바·바슈키르·타타르공화국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다종다양하게 살아가는 이들의 역사는 무엇으로 한 권의 통사에 묶을 수 있을까. 지은이들은 이 책에서 중앙유라시아의 수천년 역사를 ‘북쪽 초원과 남쪽 사막의 어울림, 북쪽 유목민과 남쪽 정주민의 공생’이라는 큰 줄거리로 담아낸다. 유럽 · 중국사 통해서 봤던 훈 · 흉노 · 돌궐 · 스키타이… ‘타자의 시선’ 걷고 보니 초원 · 사막에 수천년 문화 유라시아 북부의 카스피해, 몽골고원 등지 초원·산악 지대에서 목축을 하며 살아온 유목민들과, 그 남쪽 사막의 오아시스에서 농업과 상업으로 삶을 이어온 정주민들은 그 역사의 두 축이다. 이들은 광활한 땅에서 때로는 침략·정복하며 때로는 정치·경제의 공생을 이루며, 유럽과 중국사와는 다른 그들만의 중앙유라시아 세계를 이뤄냈다는 것이다. 동서를 융합하는 이슬람과 티베트 불교(라마교)의 오랜 전통은 이 지역 문화 정체성의 뿌리가 됐다. 13~16세기는 이처럼 무수하게 흩어지고 모였던 유목민들의 군사·정치력과 오아시스 정주민의 경제력이 가장 잘 맞물려 “중앙유라시아 세계의 에너지가 최대로 발휘된 시대”다. 초원·사막·고원에 흩어져 그동안 낱개의 역사들로 존재했던 중앙유라시아는 처음으로 대몽골국(에케 몽골 울루스)에 의해 통합돼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역사의 경험을 지니게 된다. 게다가 17세기 ‘몽골제국의 황제권을 사실상 위임받은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는 만주·몽골·한족의 연합 정권 성격으로 출범하면서 중앙유라시아는 동서를 잇는 간선 지대로서 더욱더 조명을 받을 기회까지 마련했다. 그러나 지은이들은 이후 청조에서 “중앙유라시아의 주변화”가 급속히 진행됐다고 해석한다. 청조는 몽골·티베트·동투르키스탄을 차례로 지배했지만, 칭기스 칸 일족이 실현했던 중앙유라시아의 통합보다는 동아시아 세계 군림을 목표에 두면서 중앙유라시아의 상당 부분은 사실상 동아시아 세계의 주변부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특히 청나라와 러시아, 중화인민공화국과 소련 사이에서 이들의 역사는 목소리를 더욱 잃어버리고 말았다. 이 책의 앞부분에선 야만인과 오랑캐라는 ‘타자’로 등장했던 중앙유라시아 민족들이 고대시기에 석기·청동·고분문화 등을 지녔으며 부족 연합의 정치체제를 나름대로 번듯하게 갖췄음을 보여준다. 돌궐족은 7세기에 독자적 돌궐문자를 지녔다. 민족이 있는 곳에 정치·문화가 존재했음은 당연한 일인데도 늘 주변인과 타자의 시선으로만 그들을 바라봤던 역사의 편견을, 이 책은 다시 돌이켜 생각하게 만든다. ? 6s오철우 기자 cheolwoo@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