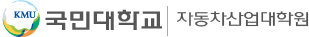[중앙일보 조중빈] 신용사회와 신뢰사회는 비슷한 말 같지만 천지 차이가 난다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한 적이 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월셋집을 구할 때의 일이다. 집을 둘러보고 집주인과 조건을 맞춰본 다음 계약서에 서명하려는 순간 집주인이 짐짓 망설였다. 미국 내에서 다달이 납부한 기록 같은 것이 없냐는 것이다. 전에 월세를 낸 기록이라든가 아니면 전화요금이나 전기요금 영수증도 좋다는 것이다. 여태까지 내가 누구이고 무엇 하러 왔고 내 가족은 어떻고 하며 설명한 것은 아무 소용없는 일이란 말인가? 더 기막힌 일은 새로 전화를 놓는데도 내놓을 만한 기록이 없으면 상당한 금액의 보증금을 예치하라고 했다. 당신이 누구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뭔가 꾸준히 믿을 만한 일을 했다는 기록, 영어로는 크레디트, 우리말로는 신용이 문제가 되는 사회, 이것이 신용사회다.
우리는 어떤가? 그런 식으로 나오면 쩨쩨한 사람이라고 왕따당한다. 그 사람의 행색이나 용모를 본 다음 무엇 하는 사람인지, 가까이 지내는 사람은 누가 있는지 정도 파악되면 믿을 만한지 아닌지가 결정 난다. 결정한 다음에는 통 크게 꽉 믿어버린다. 발등 찍힐 때까지 말이다. 이것이 믿는 사회, 곧 신뢰사회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사회가 꾸려가는 정치는 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신용사회의 정치는 의심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당신이 누구인지는 상관없고 영수증 낸 적이 있느냐고 들이대고 있지 않은가. 믿기로 결정해 놓고도 계속 감시한다. 한 번 잘했(냈)다고 계속 잘한(낸)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고양이를 믿는다고 해도 생선은 절대로 안 맡긴다. 살벌하고 피곤하고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
우리 '믿음의 자식들'이 꾸려가는 정치는 어떤가?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혀도 또 어디 믿을 만한 사람 없나 찾아 나서는 것이 한국 사람들이다. 믿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에 와서 현 정부가 사방팔방으로 뭇매를 맞고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은 이 '믿음의 자식들'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다. 이들은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잘 모를 때에도 영수증을 내놓으라고 들이대거나 가진 것이 뭐 있느냐고 조사하려 들지 않았다. 두 뺨에 흐르는 눈물을 보고는 그냥 결정해 버렸다. 저 정도면 이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을 청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믿음의 자식들'이 바보가 아니다.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니다. 정치가들을 시시콜콜하게 감시하고 다니지는 않지만 그들에게 거는 기대가 큰 만큼 그 믿음이 배반당했을 때 분노 또한 크다.
'믿음'에 대하여는 '덕치(德治)'로 보답하는 것이 순리다. 덕치는 자기 자신에게 진실함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려면 남보다는 자신에게 더 엄격해야 한다. 그러나 요사이 우리는 그 반대의 기류를 본다. 대통령은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말한다. '바다이야기'와 내 조카는 무관하다고 미리 못을 박기도 한다. 대통령 임기가 아직 한참 남았는데 퇴임 후에 하고 싶은 일에 대해 간단없이 이야기가 이어진다. 대통령이 그의 가신을 남보다 먼저 사면한다.
어느덧 개인의 일이 나라의 일이 돼버렸다. 절대권력 속에서 감각이 마비되자 사(私)가 곧 공(公)이 된다. 그리고 짐(朕)이 곧 국가가 된다. 이로써 '믿음'과 '덕치' 사이의 대화가 끊어졌다.
필자도 '믿음의 자식'이다. 그 증거는 이것이다.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이 나라를 위하던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그럴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또 국민에게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고 말하기보다는 "희망을 갖고 다시 찾아보자"고 말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마디 더 하고 싶다. 이번에는 눈물에 약해지지 말고, 영수증은 안 챙겨도 능력과 품격은 꼭 챙기자고.
조중빈 국민대 교수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