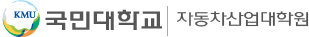| [중앙시평] 선거 주기 일치시키면 큰일난다 / 조중빈 (정외) 교수 | |||
|---|---|---|---|
 [중앙일보 조중빈]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여러 번 망설였다. 중요한 문제이기는 한데 딱히 쟁점이 되지도 않고, 현실화될 가능성도 별로 없는 문제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이 생뚱맞을 것 같아 그랬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의 김한길 원내대표가 국회연설에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주기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또 끼워 넣었다. '또'라고 하는 이유는 임채정 국회의장도 그 말을 했고, 김근태 당의장도 같은 주장을 했기 때문이다. 여당에서 이 문제를 거론할 때마다 한나라당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당이 작전을 펴는 것이라 치부하고는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다. 정당들이야 잿밥이나 챙기려 들겠지만 우리 국민은 뜬금없이 닥쳐올지도 모를 헌법 개정 파동에 단단히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다. 마침 지난주 막을 내린 미국의 중간선거는 이 점에 있어 우리에게 많은 시사를 해 주고 있다. 언론이나 대중의 관심은 미국의 상원.하원.주지사 선거가 민주당으로 넘어가느냐 마느냐에 집중됐고, 그럴 경우 북핵을 포함한 대북 정책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점치고 있었다. 아닌 게 아니라 12년 만에 민주당은 상하 양원을 동시에 장악했고, 급기야 럼즈펠드 국무장관이 책임을 지고 즉각 사임했다. 얼마나 역동적이고 극적인가. 그런데 중간선거가 아니었더라면 집권당의 실정에 대해 이렇게 준엄한 철퇴를 내릴 수 있었을까. 만약 우리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주기를 일치시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동시에 선출하면 중간선거는 없다. 중간선거가 없으면 중간평가는 불가능하고, 정치는 모 아니면 도가 된다. 바로 이런 점을 우려해 미국 '건국의 시조들'(Founding Fathers)은 선거 주기를 일부러 엇갈리게 정해 놓았다. 하원의원의 임기는 2년, 대통령의 임기는 4년, 상원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2년마다 선거가 있게 되고 미국인의 마음속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와 대통령 선거가 없는 해로 구분돼 자리 잡고 있다. 또 선거마다 상원의원의 3분의 1이 선거를 치르게 돼 있다. 복잡하지만 그 기본 정신은 한 번의 선거에서 동일 정당이 의회와 대통령직을 한꺼번에 '싹쓸이'할 가능성을 봉쇄하자는 것이다. 선거를 통해 권력 분립, 견제와 균형을 제도화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하니까 우리도 하자는 것이 아니다. 여당에서 집요하게 선거 주기 문제를 거론하는 이면에 혹시 잘못된 현실인식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되기 때문이다. 5년마다 4년마다, 또 중간에 끼어드는 지방선거가 혼란스럽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혹시 이를 빌미로 여권이 가지고 있는 '억울한' 마음을 알게 모르게 여기에 투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열린우리당이 국회의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기만 했다면 사사건건 한나라당에 발목을 잡힐 리도 없고 오늘날과 같은 참담한 실패는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바닥에 깔려 있는 것은 아닐까. 국회는 지배의 대상이 아니라 타협의 대상이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래로 어떤 정부도 '여소야대' 또는 '분점정부'라는 장애물을 피해 갈 수 없었다. 이제 억지로 '여대야소'를 만들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여소야대'가 최선이라거나 최악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정상 상태라고 이해하고, 대통령의 정치 실적이 좋을 경우 '여대야소'는 보너스로 얻는 것이라는 생각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규칙적 중간선거제도다.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치른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그리고 재.보궐 선거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유권자가 얼마나 '바람'에 민감하고, '싹쓸이'에 능한지 알 수 있다. 탄핵 바람에 그야말로 '엊그제' 출범한 정당이 제1당이 됐고, 바로 그 정당이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는 거의 전멸당했다. 한국 정치에서 '바람'이 잦아들 때까지만이라도 규칙적 중간선거는 있어야 한다. 이해가 잘 안 되면 지금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를 보라. 동시선거 덕분에 거의 한나라당 일색이다. 누가 한나라당을 견제하나? 조중빈 국민대 교수정치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