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땀 한 땀 빚는 공예? 이젠 한 줄 한 줄 출력해요 / 정용진(금속공예학과) 교수 | |||
|---|---|---|---|
|
한국 공예가 3D 프린터 작업에 눈 뜨고 있다. 예술에 가까운 일상용품으로써 공예의 영역은 수작업의 이미지가 강했다. 장인이 한 땀 한 땀 빚어 만들었다는 설명과 어울린다. 그런데 요즘 작가들은 3D 프린터로 공예품을 ‘출력’한다. 금속, 도예, 옻칠 등 분야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3D 프린터로 완제품을 만들거나 일부만을 출력해 공예품과 결합해 쓰는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3D 프린터로 출력한 공예품은 어딘가 어색하다. 이런 트렌드를 어떻게 봐야 할까. 금속공예가인 정용진 국민대 교수의 설명은 이렇다.
“공예품을 만들 때 오로지 손으로만 만든다고 생각하는 건 오해다. 디자인한 뒤 자르고 다듬는데 기계의 힘을 빌려야 하는 작업이 많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3D 프린터는 우리에게 공예품을 만드는 ‘도구’ 중 하나다.” 공예 작가들은 3D 프린터로 손으로 만들 수 없는 형태를 구현할 수 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도예가 안성만씨는 도예 작업에 적합한 3D 프린터를 직접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요즘 보급화된 3D 프린터가 플라스틱 계열의 소재를 쓰는데 반해 도예의 주재료는 흙이어서 그렇다. 1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5 공예트렌드페어’에서 안씨는 3D 프린터를 전시장 내에 설치해 도자기를 만드는 작업을 시연했다. 현장에서 지켜본 결과, 27.1㎝ 높이의 네잎클로버형의 옹기가 출력되기까지 1시간이 걸렸다. 컴퓨터 프로그램에 입력된 대로 3D 프린터의 얇은 노즐은 네잎클로버 모양을 반복해 그려나갔다. 노즐 끝에서는 1㎜ 두께의 점성 있는 옹기토가 가느다란 선처럼 나왔다. 이 선이 271층 쌓이자, 작업이 끝났다. 안씨는 “3D 프린터를 활용하면 지금껏 도자기를 만드는 기법으로 만들 수 없는, 독특한 각을 가진 작품을 만들 수 있다”며 “도자기가 출력되면 자연건조하고 두 번 굽는 나머지 과정은 똑같다”고 말했다. 옻칠 작가 윤상희씨는 3D 프린터로 출력한 기하학적이면서 유기적인 플라스틱 소재에 옻칠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스피커, 팔찌 등 다양한 용도의 공예품들이다. 향후 전망은 어떨까. 작가들은 3D 프린터의 값이 더 싸질수록 이를 활용한 작업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미 서울 종로 귀금속 가게 대다수가 3D 프린터 업체에서 출력한 귀금속 틀을 쓰고 있다. 사람들이 직접 만들 때 드는 인건비에 비해 훨씬 저렴해 인기다. 우려도 있다. 3D 프린터가 더 상용화될 수록 디자인 원본을 도용하는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부담이다. 정 교수는 “애써 만든 디자인이 3D 프린터로 금방 카피되는 시대가 오면 이를 보호하는 법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문보기 : http://news.joins.com/article/1926847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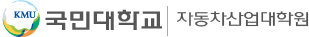


 3D 프린터가 다품종 소량생산에 적합한 생산 도구라는 설명도 있다. 정 교수는 지난해 열린 서울디자인페어에서 플라스틱 계열 소재의 조명등을 3D 프린터로 출력해 선보였는데, 그 모양이 유려하다. 종이를 접어 만든 것 마냥 등의 표면각이 다채롭다. 정 교수는 “디자인한 도면을 3D 프린터 업체에 맡겨 하루 만에 출력했다”고 했다. 그는 “플라스틱으로 깎았다면 시간이 아주 오래걸렸을 것이고, 금속 틀을 만들어 찍어낸다면 틀 제작에 엄청난 비용이 든다”며 “대량 생산한다면 틀 제작을 해야겠지만, 소량생산에는 3D 프린터가 가장 경제적이다”고 덧붙였다.
3D 프린터가 다품종 소량생산에 적합한 생산 도구라는 설명도 있다. 정 교수는 지난해 열린 서울디자인페어에서 플라스틱 계열 소재의 조명등을 3D 프린터로 출력해 선보였는데, 그 모양이 유려하다. 종이를 접어 만든 것 마냥 등의 표면각이 다채롭다. 정 교수는 “디자인한 도면을 3D 프린터 업체에 맡겨 하루 만에 출력했다”고 했다. 그는 “플라스틱으로 깎았다면 시간이 아주 오래걸렸을 것이고, 금속 틀을 만들어 찍어낸다면 틀 제작에 엄청난 비용이 든다”며 “대량 생산한다면 틀 제작을 해야겠지만, 소량생산에는 3D 프린터가 가장 경제적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