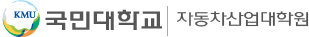| 예술의 정직성과 대면한 고독했던 조각가, 자코메티 / 최태만(미술학부) 교수 | |||
|---|---|---|---|
|
1939년 프랑스 파리, 카페에 홀로 앉아 있던 조각가 알베르토 자코메티에게 누군가 술값을 대신 내달라고 부탁했다. 놀랍게도 그는 당대 유명 인사였던 실존주의 철학자이자 문학가 장 폴 사르트르였다. 네 살 아래 사르트르와 열정적인 대화를 나누며 우정을 쌓았다. 자코메티는 독일 나치가 파리를 점령한 이후인 42년 고국 스위스로 돌아갔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제네바에서 지낼 동안 제작한 작은 조각들을 성냥갑 속에 담아 다시 파리로 돌아왔다. 그때의 그는 과거의 자코메티가 아니었다. 자코메티는 모델과 자신 사이에 놓인 거리에 대해 늘 부담을 느꼈다. 그래서 모델을 봤을 때의 기억에 의존해 작업했다. 그 과정에서 신체의 체적을 줄여나가는 대신 형태를 길게 늘어뜨리는 방법이 나타났다. 이는 조각이 오랫동안 의지해왔던 재현으로부터의 결별이다. 내면의 생명을 찾고자 한 선택이기도 했다. 그 예를 대표작 중의 하나인 ‘걸어가는 사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깡마른 두 다리. 그 사이로 바람이 몰아치면 금방 쓰러질 것만 같은 허약한 육체임에도 두 발은 굳건히 땅을 딛고 있다. 자코메티의 이 조각은 15세기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조각가 도나텔로의 ‘막달레나 마리아’에서 볼 수 있는 비참함을 떠올리게 만든다.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말라비틀어진 육신을 추스르며 회개하고 있는 한 여성의 늙고 볼품없는 앙상한 몰골은 버림받은 인간이 겪는 절망을 보여준다. ‘걸어가는 사람’과 ‘막달레나 마리아’는 육신의 허약함이라는 맥락에서 공유하는 부분이 있다. 자코메티의 작품에선 ‘막달레나 마리아’가 보여주는 육체에 대한 학대나 종교적 고해는 나타나지 않는다. 대신 전쟁을 겪은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응시하고자 하는 고독한 성찰이 깃들어 있다. 자코메티는 계속 서 있으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그 조각이 자신과 닮았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사실 ‘걸어가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형태가 아닐 수 있다. 우리는 근육과 지방이 제거된 육체와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성냥개비처럼 가느다란 두 발을 보지만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공간은 열려 있다. 자코메티는 시선에 방해가 되는 것을 모두 비워냄으로써 깡마른 육체를 감싸는 공간을 창조했던 것이다. 그래서 실루엣처럼, 유령처럼 공간에 떠오르고 있는 인체는 재현을 넘어서고 있다. 주변의 공간은 존재를 성찰할 수 있는 여백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고독을 형태적으로 묘사하려는 실존주의적 노력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사르트르는 자코메티의 작품을 ‘절대적인 것에 대한 탐색’이라고 했던 것이 아닐까. 원문보기: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848357&code=13160000&cp=n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