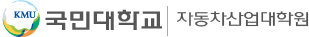언론속의 국민
| [책 읽는 대한민국/21세기 新고전 50권]<23>숲의 서사시 / 전영우(삼림)교수 | |||
|---|---|---|---|
|
[동아일보 2005-09-03 04:45]
‘문명 앞에는 숲이 있고, 문명 뒤에는 사막이 남는다.’ 19세기 프랑스의 외교관이자 낭만파 문필가였던 샤토브리앙이 남긴 이 말은 숲과 문명 간의 관계를 극명하게 보여 준다. 환경과 관련해서 곧잘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곤 하는 이 경구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나 고대 그리스와 로마 문명의 붕괴에 대입하면 더욱 설득력을 얻는다. 역사는 이들 문명이 산림 파괴로 인한 토양 유실로 농업 생산성의 저하를 가져왔으며, 그 결과 파생된 사회 혼란은 국가의 몰락과 문명의 붕괴로까지 이어졌음을 밝히고 있다. 하찮은 자연자원으로 치부되던 숲이 문명의 성쇠를 좌우하고, 숲을 지키는 일이 결국 문명의 붕괴를 막는다니 산림학 전공자로선 그야말로 호박이 덩굴째 굴러 들어온 격이다. 그러나 의문도 없지 않다. 한때 숲으로 덮여 있던 영국이 엄청난 산림 파괴에도 망하지 않고, 오늘날도 여전히 건재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런 의문을 떨치지 못하고 있을 때, 존 펄린의 ‘숲의 서사시’(원제 ‘A Forest Journey’)를 미국의 오리건주립대 구내서점에서 발견했다. 책장을 넘겨 보니, 내가 찾던 그 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영국의 경우, 서인도나 신대륙에 눈을 돌려 부족한 목재를 식민지에서 충당하는 한편, 연료를 석탄으로 대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다. 덧붙여 미국의 독립전쟁이 야기된 배경도 미국 이주민들과 영국 사이에 목재에 대한 권리를 두고 일어난 갈등에서 기인했다는 해석은, 로마제국이 시민의 불만을 무마하고자 무료 목욕탕을 운용하는 데 필요한 숲을 파괴해서 망했다는 해석처럼, 신선했다. 펄린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길가메시’부터 1880년대 미국의 통계에 이르기까지 아시아, 중동, 유럽, 서인도, 미국에 대한 이용 가능한 수많은 자료를 활용하여 지난 5000년 동안의 산림의 이용과 파괴 사례를 집대성하였다. ‘문명 발달에 있어 목재의 역할’이란 원저의 부제처럼, 이 책은 목재가 각 사회의 문화, 인구학적 특성, 경제, 정치, 외교, 기술 등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통찰하고 있다. 이 책의 최대 장점은 샤토브리앙이 150년 전에 외친 ‘숲과 문명’ 간의 선언적 경구를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잡다한 나열식 서술방법이나 서양사 중심의 시각이 아쉽지만, 이런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인간 중심의 역사 서술과는 다른 시각, 즉 숲(목재) 중심의 서술을 통하여 ‘세계 문명은 숲이 풍부한 지역에서 번성해 숲의 소멸과 함께 종말을 고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 책은 지구온난화, 사막화, 토양 유실, 생물다양성 감소 등 오늘날 제기되고 있는 전 지구적 환경 문제의 배경에 숲의 파괴가 있고, 지구 환경을 지키는 일은 결국 숲을 지키는 일임을 주지시키는 데에 말할 수 없이 효과적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오늘날 환경 관련 필독서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전영우 국민대 교수·산림자원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