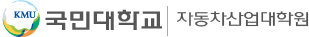언론속의 국민
| 줄기세포 논쟁 깊게 보기 / 김환석(사회)교수 | |||
|---|---|---|---|
|
[한겨레 2005-05-23 20:03] 작년에 이어 황우석 교수가 또 줄기세포연구에서 세계적인 업적을 이루어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다. ‘산업혁명을 능가하는 생명과학혁명’, ‘황우석 쓰나미’, ‘의학계의 아인슈타인’ 등등으로 대서특필되는 기사에 국민과 정치권이 감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작년과 비슷하다. 이에 파묻혀 작년에 <네이처>지와 한국생명윤리학회에서 난자채취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또 올해 3월말에는 기독교계에서 배아연구를 허용한 생명윤리법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는 사실은 거의 잊혀지거나 무시되고 있다. 오직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이 황 교수팀의 연구에 반대의사를 밝힌 사실만 눈에 띄는 기사거리가 될 뿐이다. 나는 여기서 배아줄기세포에 대한 해묵은 윤리적 논란의 내용을 다시 끄집어내고 싶지는 않다. 다만 이제는 감격과 흥분을 좀 차분히 가라앉히고 이러한 논란이 계속되는 근본적 원인에 대하여 한번 우리 모두가 더 깊이 들어가 살펴보았으면 하는 생각이다. 배아줄기세포를 둘러싼 윤리적 논란의 핵심당사자들은 과학계와 종교계이다. 사람들은 종교와 과학 사이의 대립은 피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유명한 사례로서 갈릴레오 재판과 창조론-진화론 논쟁 등을 곧잘 떠올리곤 한다. 이 사례들에서 보듯이 과학은 시대를 앞서서 객관적 진리를 밝히는 합리성의 화신이고, 종교는 독단적 교리에 사로잡혀 낡은 세계관과 윤리를 고집하는 비합리적 세력으로 연상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과학과 종교를 합리성 대 비합리성의 이분법으로 보는 태도를 비판하였다. 그는 인간의 모든 사회적 행위를 전통적 행위, 감정적 행위, 도구합리적 행위, 가치합리적 행위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과학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수단을 탐색하고 추구한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도구합리적 행위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종교는 성공 전망과는 무관하게 어떤 가치에 대한 자신의 신념에 따라 목숨도 바칠 수 있는 가치합리적 행위의 대표적 유형이다. 그러므로 배아줄기세포를 둘러싼 과학과 종교의 갈등은 차원이 다른 두 합리성 사이의 갈등이지 결코 합리성 대 비합리성 사이의 갈등은 아니다. 황우석 교수를 비롯한 과학자들은 난치병 치료라는 목적을 위해 배아줄기세포가 가장 뛰어난 수단임을 강조한다. 반면에 종교계에서는 인간의 존엄성과 배아의 생명권이라는 가치가 배아줄기세포의 수단적인 효율성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일견 끝이 안보이는 이러한 논리싸움의 쳇바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우리는 베버의 통찰을 다시 한번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그는 근대의 도구적 합리성이 프로테스탄트의 종교적 윤리에서 나온 것이며, 과학연구의 목적과 동기는 오늘날도 여전히 특정한 가치판단에 따른 것임을 지적한다. 그런데 과학과 도구적 합리성이 가치합리성을 부정하고 사회를 지나치게 지배하게 되면, 삶은 목적과 의미를 상실하고 인간은 자유로워지기는 커녕 오히려 ‘쇠우리’에 갇히는 역설적 결과를 초래한다고 그는 경고하였다. 이제 과학은 도구적 합리성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건강한 가치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종교도 교리에 따라 자신의 가치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가치들과 대화하고 관용하는 자세를 배워야 한다. 과학이나 종교나 자신의 입장에서 사회를 지도하려 들지 말고, 오히려 사회의 여러 목소리들을 경청하고 자신의 기존 입장을 바꿀 수 있는 민주적 태도를 체화해야 할 것이다. 김환석/국민대 사회학과 교수·시민과학센터 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