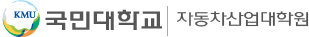언론속의 국민
| 배아의 사회학 / 김환석(사회)교수 | |||
|---|---|---|---|
|
[한겨레 2005-06-27 17:54] 배아가 줄기세포 논쟁을 통해 정치적 의제로 떠올랐다. 배아란 원래 아직 태아로 성장하기 전인 8주 이내의 수정란을 뜻하는 말이었으나, 체세포핵 이식을 통한 복제배아가 나타난 후 수정이 아니어도 배아는 창출된다는 사실이 처음 알려지게 되었다.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윤리적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배아 줄기세포는 시험관 수정 후 냉동보관된 배아를 사용해 만들거나 황우석 교수의 연구에서처럼 복제 배아를 이용해 만들어진다. 줄기세포는 수정 또는 복제 후 14일 이내의 초기 배아에서 추출하는데, 이에 대해 배아 줄기세포 찬성 과학자들은 ‘원시선’ 등 인간 개체의 특징이 나타나기 이전이므로 단순한 세포 덩어리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종교계에서는 지난번 정진석 대주교의 성명에서 보듯이 배아 줄기세포 연구는 “일종의 살인과도 같은 인간배아 파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태도를 취한다. 이미 지난 3월 말 기독교 계통의 생명윤리운동협의회에서는 배아 줄기세포 연구를 허용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대해 인간존엄성 침해와 배아의 생명권 박탈 등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해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결국 배아 줄기세포에 관한 생명윤리 논쟁은 배아를 인간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의 핵심적 쟁점으로 집약된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배아가 인간으로 발전할 모든 잠재력을 지녔지만 동시에 아직 세포 덩어리로도 볼 수 있는 모호한 특성을 지닌 존재라는 점에 있다. 그러므로 배아는 그것을 바라보는 이의 관점과 목적에 따라서 인간으로도 세포 덩어리로도 간주될 여지가 있으며, 이 때문에 배아의 지위에 대한 논쟁은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는 배아의 지위를 둘러싼 이러한 대립이야말로 주체와 객체, 인간과 비인간, 사회와 자연이라는 이분법을 통해 세계를 인식하고자 했던 근대주의적 사고방식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한다. 근대주의는 세계 안의 모든 복잡한 존재들을 이렇게 큰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 놓고, 그 한편(즉 주체, 인간, 사회)에만 존엄성을, 나머지 한편(객체, 비인간, 자연)에는 아무 존엄성도 부여하지 않는 비대칭적인 윤리를 내포하고 있다. 이 면에서 배아 줄기세포 논쟁의 두 당사자인 과학계와 종교계는 서로 평행선을 달리며 대립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근대주의적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 흔히 간과된다. 유명한 과학사회학자인 브뤼노 라투르는 근대주의에서는 ‘인간’으로 인정되면 모든 권리가 부여되어 정치나 윤리의 영역이 되고, ‘비인간’ 사물로 규정되면 모든 권리가 박탈되어 과학의 독점영역으로 간주된다고 지적한다. 우리 근대인은 ‘인간’ 외의 존재에 대해 어떤 존중을 해야 할지 한번도 논의한 적이 없으며, 현대의 정치에는 인간의 대표만 있지 다양한 사물의 대표는 없다는 점을 개탄하면서 그는 사물까지 포함하는 확장된 민주주의를 주장한다. 만일 배아를 ‘인간’이라 분류하면 존엄성이 부여되고 ‘비인간’이라 분류하면 아무 존중도 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로 취급해야 하는 것일까? 배아는 ‘인간’이 아니면 모두 ‘비인간’으로 간주하는 근대주의적 이분법과 비대칭적 윤리의 한계를 드러내는 좋은 사례다. 이번 헌법소원은 근본적으로 이런 이분법적 인식에 기반한 근대주의적 헌법에 비근대적 존재인 배아의 지위에 대한 판결을 호소하는 역설을 내포한다. 인간이든 비인간이든 배아는 그 자체로서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 김환석/ 국민대 교수·과학사회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