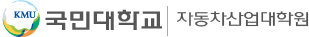언론속의 국민
| <포럼>‘제2 이중섭 위작’ 논란 막는 길 / 이명옥(미술)겸임교수 | |||
|---|---|---|---|
|
[문화일보 2005-07-16 13:14] 미술시장에 황금알을 낳은 거위에 비유되는 피카소가 생전에 파격적인 말을 남겼다. “어떤 사람이 내게 재테크의 귀재들이 미술품에 엄청난 돈을 지 불하는 까닭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그것은 소장가들이 노련한 사 업꾼이기 때문이다.” 피카소가 이처럼 미술품 투기를 조장하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은 것은 그가 이미 미술품과 돈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파악 했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대체 미술품은 왜 그토록 비싼 것일 까? 대답은 간단하다. 세상에서 단 한 점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일 미술품이 책이나 음반처럼 무수히 복제된다고 가정해보자. 요즘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이중섭 위작 파문 같은 추태는 더 이상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생각해 보라. 이중섭 작품을 탐내 는 사람은 갈수록 늘어나는데 정작 세상을 떠난 이중섭은 더 이 상 작품을 생산하지 못한다. 바로 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 해 위작 시비가 끊이지 않는 것이다. 작품이 희귀할수록, 미술품 에 관한 정보가 베일에 가려 있을수록 위작은 극성을 부린다. 내친 김에 유럽을 발칵 뒤집었던 세기의 베르메르 위작 사건을 소개한다. 2차 대전 후 반 메헤렌이라는 삼류 화가가 네덜란드 국보급인 베 르메르 작품을 나치 지도자인 괴링에게 팔아 넘긴 혐의로 전격 기소됐다. 졸지에 매국노로 전락한 반 메헤렌은 겁이 덜컥 났던 가. 문제의 그림은 진품이 아니며 자신의 작품이라는 충격적인 주장을 펼쳤다. 그는 나치에게 협력한 반역죄보다 위작이 더 가 벼운 형벌을 받는다는 판단 끝에 특급비밀을 털어놓은 것이다. 그러나 정작 미술계는 범법자의 고백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였 다. 그럴 수밖에 없는 속사정은, 네덜란드 미술사학계의 거물이 요 족집게 안목으로 명성이 자자한 ‘아브라함 브레디우스’가 진품으로 극찬한 바람에 저명한 보이만스미술관이 가장 비싼 값 을 지불하고 이 작품을 소장한 뒤였기 때문이다. 이후 베르메르 위작사건은 유럽 미술계의 뜨거운 감자로 변했으 며, 네덜란드 최고 감정전문가와 범죄자의 사활을 건 한판 승부 로까지 이어졌다. 결국 반 메헤렌은 법정에서 위작 시연을 하는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가까스로 반역죄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 이런 우스꽝스러운 사례는 유럽미술사학계의 권위자도 가짜 그림 을 가려내기엔 역부족이었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작을 방지할 대안은 없는 것일까? 국내 미술계 일부에서는 감정사 자격증 제도와 국가 차원의 감정 기구를 설치하자는 의견을 대안으로 내놓기도 하지만 막상 이를 실현하기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해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앞으로 미술품에 관한 모든 서류를 기 록으로 남기면 만사형통인 것이다. 예를 들어 미술가는 작품 목 록을 만들어서, 작품이 팔릴 때마다 그 과정을 낱낱이 기록하고, 판매상인 화랑은 작품매매계약서와 작품보증서를 반드시 작성해 구매자에게 제공하며, 컬렉터는 작품의 이력서와 서류를 소장품 과 함께 보관하면 저절로 해결된다. 이런 지극히 초보적인 일을 소홀히 취급한 벌로 툭하면 위작 시 비가 벌어지고,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다. 너무 원시적 인 방법이라고 행여 손사레를 치는 독자가 있다면? 천만에. 실제 로 넘쳐나는 위작으로 골머리를 앓던 19세기 컬렉터들은 이 원시 적인 방법을 써서 상당한 효과를 보았다. 소장가들은 예술가가 살아 있을 때 직접 찾아가 진품 여부를 확인 받은 다음 그 사실을 기록한 문서를 금고에 보관했다. 이런 사례에 비추어볼 때 기록을 남기는 습관만이 제 2의 이중섭 위작 파문을 막는 예방책임을 거듭 확신한다. [[이명옥/사비나미술관 관장, 국민대 겸임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