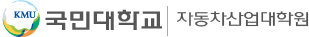| ‘두 문화’와 과학기술사회 / 김환석 (과학사회학) 교수 | |||
|---|---|---|---|
 과학기술의 빠른 발전과 이에 연계된 사회문화 변화로 우리나라도 과학기술 사회로 진입하였다. 이는 현재 우리의 일상생활을 둘러싸고 있?흔한 물건들 그리고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는 사회적 쟁점들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휴대전화, 컴퓨터, 엠펙3(MP3), 디지털 카메라, 전자오락, 위성방송, 감시카메라, 인터넷 실명제, 유전자 검사, 배아 줄기세포, 유전자 조작식품, 환경호르몬, 수돗물 불소화,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등등 …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오늘날 한국인의 삶을 구성하는 것 중 과학기술에 의존하지 않거나 과학기술이 조금이라도 관련돼 있지 않은 것들을 찾아보기가 힘든 실정이다. 이렇게 ‘두 문화’의 괴리 현상이 심하면 과학기술과 사회문화의 새로운 결합으로 말미암은 복잡한 현상과 문제를 올바로 이해하고 대처하는 데 필요한 복합적 지식과 새로운 태도는 생겨날 수가 없다. 과학기술자와 비과학기술자는 서로 다른 지식의 세계에 갇혀 상호 소통의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소통할 언어가 없기 때문이다. 스노가 지적했듯이 ‘두 문화’는 이미 서구에서도 문제가 된 바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특히 그것이 심각한 원인은 ‘문과-이과’로 구분된 교육체계에 있다고 과학사학자 김영식 교수는 지적하고 있다. 고등학교에서 시작되는 이러한 구분은 대학으로 이어져 우리 학문사회에 견고하고 끈질긴 장벽을 형성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문과에 속한 사람은 이과의 분야들이 인간의 가치나 감정, 상상력과는 상관없이 무미건조하고 기계적인 것이어서 이과의 사람들 역시 맹목적이고 정확성만 따질 뿐 인간과 사회의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 무관심할 것으로 생각하는 반면, 이과에 속한 사람들은 문과의 분야들이 명확한 기준이 없이 잡다하고 부정확한 것이어서 문과의 사람들 역시 정확히 아는 것 없이 말장난을 통해 얼버무리기나 하는 부류로 여기곤 한다. 한마디로 문과든 이과든 한 쪽에 속한 사람들은 다른 쪽의 활동이나 종사자들의 성격에 대해 무지하게 되고, 이러한 무지는 결국 상대적으로 편견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과학기술 사회를 포기하지 않는 한 ‘문과-이과’로 나뉘어 이런 무지와 편견을 재생산하는 ‘두 문화’ 체제를 언제까지나 지속할 수는 없다. 문과와 이과 사이의 장벽은 학문 분야들 사이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념적·제도적 장벽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라는 김 교수의 지적이 맞다면, 과학기술 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하여 이제 문과-이과의 구분은 고등학교와 대학의 교육체계에서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예컨대 황우석 사태의 초기에 나타났던 과학기술자와 인문·사회과학자 사이의 윤리 논쟁, 그리고 논문 조작이 사실로 드러난 이후 지속되고 있는 과학계와 황우석 지지 대중 사이의 첨예한 대립은 그 뿌리에 ‘두 문화’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뼈저리게 깨달아야 한다. 김환석 /국민대 교수·과학사회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