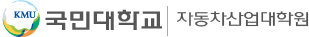| “시민참여 다 옳은가, ‘황빠’로 깨우쳐” / 김환석 (사회학과) 교수 | |||
|---|---|---|---|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과학에서 목격한 중요한 경향은 ‘과학의 상업화’였습니다. ‘황우석 사태’도 결국 그 산물 아닙니까. 앞으로 더욱 가속화할 겁니다. 그러니 우리 삶을 좌우하는 과학기술에 대해 비판적 성찰과 대안을 찾으려는 시민사회의 노력도 더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민주화를 내건 시민연구소 단체인 시민과학센터가 생긴 지 10돌을 맞아, 김환석 센터 소장(국민대 교수·과학사회학)은 2일 “기업이나 잘 사는 계층만을 위한 과학이 아니라 일반 시민을 위한 ‘공익과학’ 운동이 활발히 벌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과학센터는 이날 서울 정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한국의 과학기술 민주화,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10돌 기념 심포지엄을 열었다. “과학기술에 무슨 민주화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지요. 다른 시민단체들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과학기술 정책 결정과 과학 연구 방향에 왜 과학자 아닌 시민이 참여해야 하는지 설득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1997년 11월22일 참여연대 안의 ‘과학기술 민주화를 위한 모임’으로 출범한 시민과학센터는 지난 10년 동안 우리 사회에 과학과 기술을 보는 ‘다른 시선’을 불어넣는 구실을 해왔다. 유전자조작식품과 생명복제 같은 과학기술의 쟁점을 시민 패널들이 전문가와 함께 토론하면서 판단하는 합의회의를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함께 98년 처음 시도했다. 과학기술이 미래 사회에 끼칠 영향을 따져보는 기술영향평가의 충분한 제도화를 주장해왔다. 생명윤리법 제정과 황우석 사태 이후 연구윤리의 제도화에도 적극 관여했다. 주로 생명공학, 나노·환경기술, 원자력 에너지 등에 관심을 기울였다. 황우석 사태는 시민과학센터에도 크나큰 경험이었다. “‘황빠’ 현상도 일종의 시민참여입니다. 이런 점에서 과연 시민참여가 무조건 좋으냐는 심각한 의문을 던져 주었죠.” 센터 안팎에서 여러 논의가 일었고 ‘과학기술 시민참여’ 논쟁도 벌어졌다. 김 소장은 “황빠 현상은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느냐에 따라 시민참여 운동도 평가돼야 함을 깨닫게 했던 계기”라며 “열린 마음으로 여러 견해를 학습하고 토론하고 숙고하면서 자기 의사를 펴는 시민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열린 마음과 비판적 성찰을 갖춘 시민이 더 많아져야 과학 상업화를 견제하고 공익과학에 대한 진지한 관심도 많아질 것”이라며 “과학기술계도 이런 시민사회와 균형을 이룰 때 건전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음을 이해하고 열린 마음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28&aid=0000218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