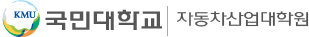| [기고] 위안부 배상 판결 어떻게 볼 것인가 / 이원덕(일본학과) 교수 | |||
|---|---|---|---|
|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지난 8일의 `똑 부러진 판결`은 법원에서 최초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사법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반인도적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는 `국가면제`의 규범보다 인류 보편의 인권 규범이 우선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징용재판 이후 심각하게 악화된 한일관계는 더욱 험난해질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총리부터 외무성까지 나서 강력 항의하며 반발하고 있다. 재판의 역풍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단순히 적반하장이라고 치부하며 일본 정부만을 비난하기에는 사태가 그리 녹록하지 않다.
법적으로만 따지면 주한대사관 등 일본 정부의 자산에 대해 압류라도 해서 배상금을 강제 집행하면 되겠지만 그것이 초래할 외교적 파장은 간단치 않다. 재판 변호인도 인정했듯이 법원이 배상 의무를 판시했지만 당장 강제집행으로 직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진 것은 아이러니하게 한국 정부이다.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일본에 강공 일변도로 나가기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외교부는 "2015년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라는 점을 상기한다"고 논평했다. 강경화 장관도 일본 정부에 `과도한 반응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로 키(low key)`로 접근하며 `관리 모드`로 대응할 요량인 듯하다. 격해진 여론에 편승하며 일본을 몰아붙이던 징용판결 때와는 사뭇 대조적이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한·미·일 삼각 공조를 강조하고 한일관계 개선을 적극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적극 평가했고 바이든 정부의 외교안보 당국자들은 수면에서 합의에 관여했다. 한국 정부는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 복원과 북미, 북일관계 정상화 등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한다는 큰 그림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맥락이 아니라도 징용, 위안부 등 해묵은 한일 과거사 문제는 해결을 꾀해야 한다.
그럼에도 대일외교가 역사 문제에 매몰돼서는 곤란하며 투트랙으로 분리 대응해야 한다는 원칙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징용, 위안부 문제는 식민지 불법성 논쟁에 근원을 두고 있다. 식민지 역사를 `이미 무효(already null and void)`라고 명문화하고 상반된 한일의 역사인식을 양해(Agree to Disagree)하는 선에서 봉합한 한일관계 1965년 체제가 존재하는 한, 과거사 갈등은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한일관계를 소용돌이 속으로 내몰고 있는 징용,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든 관리하고 수습하기 위해 대일외교에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징용 문제에 관해서는 기금 조성으로 대위변제를 통해 피해자를 구제한 후 일본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을 고려해봄 직하다. 위안부 문제는 정부가 잘못된 합의라고 평가절하했지만 파기를 선언한 것도 아닌 만큼 `2015년 합의`와의 정합성을 염두에 두고 묘안을 찾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근본적인 과거사 해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양국 정부가 협상해 일본은 식민지 불법성을 인정, 사죄하고 한국은 추가적 배상 요구를 포기하는 새 합의를 만들면 된다. 또 하나는 징용,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해 판결을 받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당분간 이 둘 다 어렵다면 차분한 외교 협상으로 현안을 수습할 수밖에 없다.
[이원덕 국민대학교 교수]
※ 이 기사는 '뉴스콘텐츠 저작권 계약'으로 저작권을 확보하여 게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