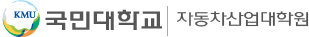| [너섬情談] 공유사무실, 도시를 바꾼다 / 이경훈(건축학부) 교수 | |||
|---|---|---|---|
|
“미래는 이미 도착해 있다.”
지난 대선에서 한 후보가 유행시킨 말이다. 미래 이미지를 선점하기 위한 선거 구호라 하더라도 어색했다. 그게 원인인지 결과인지, 전제인지 논리적 주장인지 모호했기 때문이다. 이 구절은 원래 미국 소설가 윌리엄 깁슨이 한 말이다. 사이버펑크, 사이버공간 등 신조어를 만들어낸 인물이다. 이미 1980년대에 다가올 미래의 테크놀러지가 바꿀 문명의 급진적 변화를 예견하고 탐구했다는 평을 받는다. 원문의 논지는 종종 생략되는 뒷부분을 살펴볼 때 선명해진다.
“미래는 이미 도착해 있다. 다만 아직은 골고루 분포하지 않을 뿐이다.”
미래의 중요한 기술적 요소는 일정한 기획 아래 체계적으로 개발되는 것은 아니고, 편재하며 이를 통합하는 사고가 중요하다는 맥락이다. 대표적 예가 스티브 잡스다. 그는 아무것도 발명하지 않았다. 디자이너도 엔지니어도 아니었다. 산재한 기술적 요소를 모으고 이를 뛰어난 디자인으로 통합했을 뿐이다. 가령 터치식 화면이나 손가락으로 페이지를 넘기고 꼬집듯 화면을 확대하고 축소하는 기술은 이미 개발돼 있었다. 잡스는 미래의 조각을 한데 묶어내는 상상력으로 스마트폰을 만들었다.
지난 1년의 코로나 팬데믹은 예기치 않게 미래의 조각들을 드러낸다. 물론 밝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연결보다는 격리가 중요해졌고 도심은 거리를 둬야 했다. 그 여파로 경기가 침체하고 피해는 어려운 계층에 먼저 찾아왔다. 그런가 하면 새로운 가능성도 있다. 한국의 뛰어난 디지털 인프라는 긍정의 조각이다. 여러 측면에서 다른 선진국들을 압도했다. 확진자를 추적해 유행을 억제하거나 사재기가 없었던 것도 사회적 자본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비대면 또는 원격 업무는 팬데믹이 추동하는 가장 큰 미래의 조각이다. 화상 업무와 회의를 위한 기술적 준비는 이미 오래전부터 갖춰졌지만 본격적인 실행은 코로나가 앞당겼다. 의구심으로 시작했지만 원격 근무는 의외로 효율적이었다.
공공이 공유사무실을 제공하는 것은 어떤가? 외곽의 지역 중심마다 공유사무실을 짓는다. 걸어서 닿을 수 있는 곳에 공유사무실이 있고 시민들은 여기까지만 출근한다. 물론 업무를 위한 환경은 최적으로 조성한다. 엄마는 아이 유모차를 밀고 걸어서 출근해 사무실 옆의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고 일을 한다. 다시 유모차를 밀고 퇴근하며 가볍게 장을 볼 수도 있다. 공공 원격사무실은 재택근무가 가져온 몇 가지 불편을 동시에 해결하며 획기적으로 도시를 전환할 수 있다.
첫째로 개인적 차원이다. 좁은 집에서 근무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또 하나의 컴퓨터에 부부와 학교 다니는 아이가 동시에 매달려야 하는 불편함도 해결할 수 있다. 둘째로 회사도 직원들의 업무 집중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셋째로 도시적 측면에서 효과는 막대하다. 일자리가 많은 도심에 주거를 공급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현실은 한정된 토지 문제로 거의 불가능했다. 공공 공유사무실은 반대로 주거 지역에 일자리를 공급하는 효과가 있다. 직주근접(職住近接)이 다른 형태로 가능해지는 것이다.
대학가 근처 공유사무실은 더더욱 효과적이다. 본격적인 산학 협력이 가능해지고 서울의 경우 대학이 주로 강북에 있으니 균형 개발이 가능해진다. 강남에서 시작하는 부동산 불안에 대한 근원적 해결책이 될 수 있겠다. 게다가 선순환적으로 동네 상권이 살아나고 지역이 활력을 갖는 계기가 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 연합체 ‘C40’은 지역의 소매상권이 코로나 이후의 경제 회복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한다. 교통량이 줄어드니 환경 문제 특히 탄소중립의 목표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다. 공공이 나서야 한다.
미래는 온전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이제 선진국의 선례는 없다. 우리가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 미래의 조각들을 찾아내고 그걸 꿰어내는 새 서울시장을 기대한다. 미래는 이미 도착해 있다.
이경훈(국민대 교수·건축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