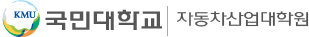| [이호선 칼럼] AI 시대, 기술경쟁 앞서 ‘기준 정립’ 시급하다 / 이호선(법학부) 교수 | |||
|---|---|---|---|
|
국민대 법대 학장ㆍ前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AI 리터러시’는 법·윤리적 이해력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인류의 사회·경제적 삶의 양식을 통째로 바꾸어 놓을 수도 있는 인공지능(AI)의 시대에 인류가 넘지 말아야 할 선(線)은 무엇인가? 기술의 진보가 인간의 존엄과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이 당연한 명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 그 기준이 기술보다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준비 중의 하나가 바로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법(AI Act)이다. 며칠 뒤인 8월 2일 EU 인공지능법의 핵심 규정들이 본격 시행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 규정이 기술을 중심에 두기보다, 사회적 신뢰와 인간 중심의 규범을 먼저 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유럽은 인공지능을 위험도에 따라 구분하고, 위험이 클수록 더 엄격한 의무를 부과하며, 위헌적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AI 시스템은 아예 금지한다.
그런데 이 규범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용어를 통한 사회적 기준의 설계’에 있다.
그 대표적 사례가 ‘AI 리터러시(AI Literacy)’이다. 우리의 경우 AI 리터러시를 주로 ‘AI 도구의 활용 능력’ 또는 ‘AI 편의성 습득’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 학교에서 코딩을 배우고, 챗GPT를 써보는 것이 AI 리터러시 교육인 양 소개된다.
하지만 EU에서 말하는 AI 리터러시는 그와 전혀 다른 차원의 개념이다. 이 법은 AI 리터러시를 ‘운용자(Deployer)’가 반드시 갖춰야 할 윤리적, 법적 이해 능력으로 본다. 이는 단순히 기술을 쓰는 능력이 아니라, 그 기술이 가져올 사회적, 정치적, 심리적, 법적 효과를 예측하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즉, “AI는 어떻게 인간의 판단을 대체하고 있으며, 어떤 편향과 차별을 내포하고 있는가?”, “AI가 제안한 결정은 과연 투명하고 책임 가능한가?” 같은 질문을 던질 줄 아는 것이 진짜 리터러시다. 이 개념은 2025년 2월부터 이미 법적 의무로 적용되고 있다.
이처럼 용어 하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정책의 철학과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AI 리터러시’를 단순한 ‘활용법 습득’ 정도로 오해하고, 법과 윤리보다 기능성과 생산성에 집중하는 접근을 반복하고 있다.
유럽은 인공지능법 시행을 앞두고 각국에 규제 샌드박스 설치를 의무화했다. 스타트업이나 연구기관이 제도적 보호 아래 AI 실험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동시에 인공지능청(AI Office)을 신설해 포괄 목적 AI 모델의 공급자를 감독하고, 기술 발전에 맞춰 분류 기준을 갱신하도록 했다. 그 어떤 기술 규정에서도 보기 힘든 일이다. 이는 AI를 단순한 산업 영역이 아닌 인간 사회 전체의 규범 문제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여전히 ‘개인정보’라는 표현에 머물고 있지만, 유럽은 이미 ‘개인주권데이터(personal sovereignty data)’라는 관점을 논의하고 있다. 우리는 아직도 ‘일반 AI’나 ‘범용 AI’라는 표현을 혼용하고 있지만, EU는 ‘포괄 목적 AI(general-purpose AI)’라는 법적 개념을 정착시키고 있다. 이런 차이는 결국 정책, 기업 책임, 시민 권리의 내용과 범위 자체를 달라지게 만든다. 이런 점에서 용어 하나 하나에 대한 언론의 책임도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인공지능은 어느새 우리의 일상에 스며들고 있다. 속도의 경쟁이 가속화될수록 기준에 대한 고민도 깊어져야 한다. 명확한 기준이 기술에 대한 신뢰를 가져오고, 기술에 대한 신뢰야 말로 기술 발전의 토양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AI 시대에 진짜 경쟁력은 더 빠른 기술이 아니라, 더 정교한 기준에 있고, 그것은 사회적·기술적 언어의 정확한 구사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