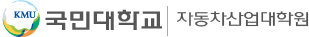| [웹기자의 문화서평] J.D 샐린저 그를 보내며. | |||
|---|---|---|---|
|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인 2010년 1월 27일. 91세의 나이로 제롬 데이비드 샐린저가 타계했다. 청소년이라면 누구든 필독서로 한 번쯤 '호밀밭의 파수꾼' 을 읽어보았을 것이다. 주옥 같은 작품들을 우리에게 남긴 그는 이제 영원히 우리의 곁을 떠난 것이다. 그저 잠시의 뉴스 거리로 흘러가버리는 듯한 그의 죽음은 책꽂이에 꽂혀있는 호밀밭의 파수꾼을 펼친 순간 너무나 선연하게 다가왔다.
▲호밀밭의 파수꾼 원서들. 대학생이라는 신분이 되고나서 어쩌면, 우리는 뜨겁고 아득하고 불안했던 어린 시절의 감정을 잊어버린 채 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불안한 시대, 청소년이라는 불안한 존재에 대해 쓰인 호밀밭의 파수꾼은 몇 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나이대의 불안하고 요동치는 심리를 날카롭게 집어내고 있다. 호밀밭의 파수꾼에서 이곳저곳을 헤매는 주인공 '홀든 콜필드'는 마치 정처 없이 부유하던 청소년 시절의 마음을 대변한다.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불만이고 그저 반항하고 싶던 그 때. 하지만 대단하게 탈선하지도 못하고 그저 모든 것을 불평하며 혼자 삭이고 투덜거리던 그 때의 마음을 생각나게 한다. 그런 홀든이 퇴학을 당하고 방황하는 며칠 동안을 따라다니며 조용히 책을 읽는 내내, 냉정하면서도 그 속에 숨어있는 샐린저 특유의 따스한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주인공 홀든 콜필드의 일러스트. 그러한 샐린저는 아이러니하게도 호밀밭의 파수꾼의 대성공 이후 청소년은커녕 그 누구와도 소통하지 않고 그 자취를 감춘 채 여생을 보냈다. 그의 첫 장편 소설 호밀밭의 파수꾼은 청소년에 대한 날카로운 시선과 당시 불안한 시대적 상황에 맞물리며 커다란 대중적 성공을 일궈내고 그는 단번에 유명 작가로 등극하게 된다. 순식간에 대중적 성공과 상업적, 비판적 관심이라는 양날의 검을 가지게 된 샐린저는 기어코 은둔이라는 길을 선택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세 단편집 "아홉 가지 이야기(1953)", "프래니와 주이(1961)", "목수들아, 대들보를 높이 올려라(1963)", 그리고 뉴요커에 실린 중편소설 "Hapworth 16, 1924" 가 1965년에 출판된 것을 마지막으로 그의 작품은 발표되지 않았다. 샐린저의 작품에 대한 문학성만큼이나 그에 대한 후문들은 커져만 갔고 그의 은둔이라는 기행과 호밀밭의 파수꾼과 얽힌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그의 죽음 이후 사람들의 제일 큰 관심은 그가 남겨놓은 유작의 공개여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세기의 작가가 우리의 곁을 떠난 것을 순수하게 슬퍼하지 못하게 된 작금의 상황은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그러나 여러 독자들의 가슴에 공감과 감동을 남겨준 그의 작품을 떠올리면서 다른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가에 대한 여부는 매우 궁금해진다. 샐린저의 작품 중에서 호밀밭의 파수꾼이 가장 유명하지만 그 이외에도 훌륭한 작품들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1948년 뉴요커에서 출판되었고 단편집 아홉 가지 이야기에 수록된 '바나나피쉬를 위한 완벽한 날'을 추천한다. 글래스 가의 천재 시모어는 사랑한 여인조차 다른 세상의 인간들처럼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영적인 팽창을 통한 자신의 세계와 보통 인간들(혹은 속물)의 세계 사이의 극차를 좁히지 못한다. 자신이 말한 이야기 속 '바나나피쉬'는 자신 안에 갇혀 죽어버리는 존재, 즉 본인을 시사한다. 결국 시모어는 자살이라는 길을 택한다. 혹자는 바나나피쉬가 시모어 자신의 존재가 아닌, 시대적으로 올바른 가치를 잊어버린 채 속물로 변하게 된 개인들을 상징하고 그렇게 변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살을 택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문학 작품이란 읽는 사람의 지식과 마음이 투영된 것이므로 정답은 없다고 본다. 이 외의 글래스 가문의 아이들을 다룬 8개의 단편도 매우 매력적이다. J.D 샐린저의 작품이 호밀밭의 파수꾼뿐이라고 생각하며 책을 덮은 학생들은 꼭 다른 작품들도 읽어보길 추천한다. 이 글을 써내려가며 이제 정말 그가 우리의 곁을 떠났음을 실감한다. 그리고 우리가 잃은 것은 다만 그뿐만이 아님도 알게 되었다. 모든 것에 서툴고 어른의 융통성이란 것도 없고 모든 것이 불만스러웠지만 세상에 불만을 터트리며 '나'를 찾아 방황하던 그 때의 나는 사라졌다. 어느새 혐오하던 속물로 가득 차버린 눈으로 타성에 젖은 세상을 보는 나를 홀든을 통해 마주 보게 되면, 그 시절의 마음을 다시 되찾아 반항적이었던, 치기 어리고 순수한 눈으로 다시금 바라보고 싶어진다. 그는 진정으로 세상을 향한 마음이 비뚤어진 것이었을까? 아니면 그 누구나 불안했던 시기를 그 누구보다 순수한 마음으로 겪고 있던 성장통 속의 작은 어른이었을까?
“난 아득한 절벽 위에 서 있어. 내가 할 일은 아이들이 절벽으로 떨어질 것 같으면, 재빨리 붙잡아 주는 거야. 애들이란 앞뒤 생각 없이 마구 달리는 법이니까. 그럴 때 어딘가에서 내가 나타나서는 꼬마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거지. 온종일 그 일만 하는 거야. 말하자면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고 싶다고나 할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