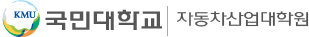| ‘영웅만들기’의 함정 / 김환석 (사회) 교수 | |||
|---|---|---|---|
 [한겨레 2005-12-13 18:48] 섀튼의 결별선언 이후 한 달 동안 전국을 폭풍처럼 혼란의 소용돌이에 몰아넣었던 황우석 스캔들은 이제 서울대의 조사위원회로 공이 넘어갔다. 따지고 보면 한 과학자의 연구논문에 대한 논란일 뿐인데, 이렇게 ‘핵폭풍’에 비유될 만큼 국가적 재앙의 위기에 몰려 정부와 온 국민이 하루하루 불안과 조바심에 떨고 있는 것은 처음부터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과연 이게 정상적인 나라에서 일어날 법한 일인가? 정상적인 나라라면 과학계 내부의 자정 메커니즘으로 쉽게 처리되었을 사건이 우리나라에서는 이 지경으로 사회적인 대혼란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은 황우석 교수가 단지 한 과학자가 아니라 이른바 ‘국민적 영웅’이기 때문이다. 그는 아이엠에프(IMF) 사태 이후 깊은 실의에 빠진 국민에게, 계층과 지역과 성별과 세대 그리고 지지정당의 차이를 뛰어넘어 미래 과학한국의 비전을 또렷이 보여주며 나라의 발전을 이끌고 갈 어떤 메시아와 같은 존재로 다가왔다. 그는 가난한 농촌 출신이지만 복제와 줄기세포 분야에서 세계적인 연구업적을 나타낸 과학영웅일 뿐 아니라, “과학에는 국경이 없지만 과학자에겐 조국이 있다”는 그의 발언이 표상하듯 진한 애국주의로 무장되어 있다. 더구나 여기에 전세계 난치병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라는 인류애까지 더해지니 그야말로 ‘위인’이 아니고 무엇이랴? 황우석 교수가 이렇게 국민적 영웅으로 떠오른 것은 물론 그 자신의 업적과 자질 덕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정부와 언론이 손을 맞잡고 이끌어 온 ‘황우석 영웅 만들기’의 결과 때문이다. 그는 원래 생명공학에서는 주변적 분야에 속하는 동물복제의 전문가였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초기에 그는 복제 소 ‘영롱이’의 성공으로 갑자기 생명공학의 스타로 떠올랐고, 심지어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 복제한 백두산 호랑이 새끼를 대통령이 북쪽에 선물할 계획(결국 실패하였지만)에 관여할 만큼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후 노무현 정부에 들어와서는 박기영 보좌관과 정동영 장관 등 청와대와 정부 및 여당의 전폭적 지원 아래 배아줄기세포 분야로 그의 영역을 확장하여 마침내 한국의 생명공학을 대표하는 인물로 세계에 떠올랐던 것이다. 그러나 어떤 과학자를 국민영웅으로 만들려고 국가가 기획하고 개입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불행한 결과만을 낳았다. 옛 소련의 스탈린 치하에서 기존의 유전학을 비판하고 획득형질 유전과 이를 이용한 농업증산을 주장하여 ‘사회주의 과학’의 영웅으로 떠받들던 리센코, 북한에서 1960년대 초 원자물리학적 방법으로 경락의 존재를 증명했다고 주장하여 ‘주체과학’의 영웅으로 한때 칭송받았던 김봉한 등이 좋은 예이다. 이들은 모두 과학적 연구성과가 국가 개입에 의해 부당하게 부풀려져 과학계에서 제대로 검증받을 기회를 못가졌던 것이 치명적 문제였다. ‘영웅 만들기’의 폐해는 또한 특정한 과학자 내지 그의 분야에 국가의 연구자원이 집중되어 과학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큰 부작용을 초래한다. 인위적인 ‘영웅 만들기’를 통해 과학을 키우겠다는 국가의 야심은 잘못된 것이다. 과학자 스스로도 과학계의 검증보다 국가의 지원을 통해 영웅이 되겠다는 욕심은 버려야 한다. 과학에서는 위대한 발견 못지 않게 조작과 사기 논란도 종종 나타나는 것이 정상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우리처럼 온 나라를 뒤흔들지는 않는다. ‘영웅 만들기’는 과학과 국가의 잘못된 결합이고 결국 핵폭풍의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다. 김환석/국민대 교수·과학사회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