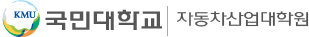| [에세이―김대환] 자녀 보호의 수위 / (음악학부) 교수 | |||
|---|---|---|---|
 21살이 된 그 애를 오랜만에 만났다. 지금은 영국 왕립 음악원에 다니는 그를 처음 만난 것은 그 애가 중1 때. 165㎝의 큰 키가 어울리지 않게 수줍어하던 여학생이었다. 그 애는 음악 전공하는 어린 학생 대부분이 그렇듯 항상 어머니와 함께였다. 중2 때, 혼자 레슨을 왔는데 그 애 어머니가 끝날 때 오시더니 대견해하며 말씀하셨다. 그 애가 오늘 처음으로 혼자 지하철을 탔다는 것이었다. 나는 솔직히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난감했다. 약국을 하느라 바쁘셨던 어머니는 중2였던 나를 혼자 독일에 보내기도 하셨다. 겨울방학 동안 쾰른에 있는 기숙사에 들어가 레슨 받으며 유학을 갈지 생각해보라는 이유에서였다. 멋 모르고 떠났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위험한 순간도 많았다. 독어는커녕 영어도 잘 못하니 그곳에서 알게 된 유학생들 전화번호가 없었다면 전철에서 졸다 역을 지나쳤을 때, 버스를 잘못 탔을 때 어찌 되었을지. 온갖 민폐를 끼치다 귀국할 때는 취리히 공항에서 길을 잃어 비행기표를 청소부에게 보여주고 데려다달라며 운 적도 있다. 덕분에 씩씩하게 자랐지만 마냥 좋지는 않았다. 어린 나에게 맏딸을 믿는다는 부모님 말씀은 수수방관하겠다는 뜻으로 들리기도 했고, 바쁘다며 학교 행사에 안 오실 때는 섭섭한 마음에 나중에 내가 아이를 갖게 되면 과보호에 극성 학부모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막상 온실의 화초 같은 그 애를 보니 뭐가 옳은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그 애의 어머니처럼 조금 늦은 나이에 딸을 낳아서일까, 나의 딸도 그 애처럼 수줍음이 많게 자라고 있다. 조금은 소심한 나에게 이 세상은 아이를 키우기에 매우 위험한 것처럼 느껴진다.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사건들은 차마 입에 올리기도 무섭다. 아는 분은 중2인 딸을 아직 한 번도 승강기에 혼자 태우지 않았다고 한다. 지나치다 싶지만 한 순간의 방심에 평생 후회할 일이 생길 수 있는 세상 아닌가. 내 부모님 같은 용기, 혹은 무모함이 없어서인지 혼자 유학 간 그 애가 가끔 궁금했었다. 다행히 참 잘 자랐다. 때 묻지 않아 오히려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혼자 열심히 헤쳐나가는 중인 것 같다. 그러나 다른 애들에 비해 더 외롭고 힘들었을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복잡하다. 도대체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적절한 보호 수위는 어디일까. 원문보기 : http://www.kukinews.com/special/article/opinion_view.asp?page=1&gCode=opi&arcid=0920638917&cp=nv |